봉황(鳳凰)과 주작(朱雀) 그리고 삼족오(三足烏) ![]() 수원객의 상고사
수원객의 상고사 ![]()
2014.01.11. 19:20
![]() http://blog.naver.com/qnrdowk/30183038941
http://blog.naver.com/qnrdowk/30183038941
봉황(鳳凰)과 주작(朱雀) 그리고 삼족오(三足烏)는 동이(東夷)의 사상에서 태어난 것이다. 봉황(鳳凰)은 봉(鳳)과 황(凰)을 이르는 말로 봉(鳳)은 수컷이고, 황(凰)은 암컷인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간혹 학자들은 봉황(鳳凰)과 주작(朱雀)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백제금동대향로'가 처음으로 발견 되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이 유물을 처음 본 학자들은 '백제금동용봉봉래산대향로'라고 이름 지었으나 내가 보기에는 신선들이 사는 봉래산의 부상나무 꼭데기에 한 마리 주작(朱雀)이 앉아 태양을 입에 물고 있는 형상이었다. 앞장에서 밝힌바 있는 산해경, 십주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봉래는 발해이자 한밝해에 있었던 신선들이 사는 나라이다. 그 나라는 단군시대를 거쳐 고구려에 그 전통을 이었으므로 한반도 전역은 고구려땅 이었다. 그런데 백제와는 전혀 무관한 유물에 백제의 지명을 붙이고, 또한 주작을 봉(鳳)이라 하였다. 봉황은 항상 암수가 함께 다니므로 봉황을 새겼다면 봉과 황을 함께 새겨야하는데 학자들은 주작을 새긴 것을 봉황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슬거머니 '백제금동대향로' 이름을 고쳤다. 이마저도 '봉래산 금동향로'로 고쳐 불러야한다.
주작은 고구려 벽화 사신도에서 남방을 지키는 상서로운 동물이다.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 중에서 '오제'의 주(注)에 말하기를 " '오방(동.서.남.북.중)에 각기 사명이 있으니 하늘에서는 제라하고 땅에서는 대장군이라 한다. 오방을 감독하고 살피는 자를 천하대장군이라 하고 지하를 감독하고 살피는 자를 지하여장군이라 한다. 용왕현구는 선악을 주관하며, 주작적표는 목숨을 주관하며, 청룡령산은 곡식을 주관하며, 백호병신은 형벌을 주관하며, 황웅(黃熊)여신은 병을 주관한다.' "하였으므로 주작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상징으로 향로에 새긴 것이다.
삼족오의 진실
산해경에 까마귀가 해를 운반한다는 기록이 있다.
"《山海經 大荒東經》: 湯谷上有扶木. 一日方至, 一日方出, 皆載于烏 "
"《산해경 대황동경》: 탕곡 위에 부목이 있다. 한 개의 태양이 오면, 한 개의 태양이 나간다. 까마귀가 해를 운반한다 "
동이(東夷)는 근본적으로 태양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神과 사람이 소통하는 수단으로 새를 신표로 삼았다. 솟대가 그 좋은 예이다. 그러므로 태양 속에 까마귀를 그린 것이다. 이른바 삼족오는 태양 속에 사는 새이며 양(陽)의 기운을 대표하는 새이므로 양의 수(홀수)로서 발을 세 개로 한 것이다. 반대로 달은 음(陰)의 기운이 가득하여 음(陰)을 상징하는 대표적 동물인 두꺼비를 그렸다. 두꺼비는 후손를 많이 낳으므로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다.

고구려 고분 '오회분사호묘' (6세기)
소재지: 중국 길림성 집안현 대왕촌
현실 천정부 안쪽 벽화이다. 해신의 머리에 삼족오가 그려진 태양이 있고 달신의 머리에 두꺼비가 그려진 달을 이고 있다.


탕곡(暘谷)은 해가 처음 돋는 곳으로 탕곡 위에 뽕나무가 있다고 한 것이다. 그것은 신선의 나라 한밝땅에서 해가 돋고 그 곳에 삼족오라는 새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것은 상고시대의 동이(東夷)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뽕나무를 규표로 하여 태양의 이동 경로를 측정한 것이라고 앞장에서 밝혔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산해경의 뜻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일을 요상한 이야깃꺼리로 만들어 버렸다. 삼족오의 기원에 관한 중국의 전설을 요약하면 요(堯)임금이 신하인 예(羿)에게 태양이 열 개나 동시에 떠올랐으니 농작물이 타 죽고 가뭄이 들었다고 하면서 활로 태양을 쏘라고 하였는데 아홉 개의 해가 떨어졌을 때 요(堯)임금이 마지막 한 개의 화살을 감추어서 한 개의 해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산해경에 주를 쓴 곽박, 원가는 이런 내용은 산해경에 없다고 하였다. 각종 기록에 의하면 예(羿)가 열 개의 태양을 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설에는 까마귀를 쏘았다고 쓰여진 기록도 보인다. 어떤 기록은 태양이 땅에 떨어지면 까마귀로 변해 있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해오고 또 시인, 문사들이 이를 기록하므로서 삼족오는 중국신화에서 탄생한 것으로 변해갔다. 다시말해 고구려의 삼족오는 중국 신화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학자들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오해이다. 산해경의 숨은 천문학을 몰랐던 것이다. 상고시대 동이족은 모두 도통한 사람들이며 상통천문의 천문학자이자 대철학자이었다.
세발 까마귀가 태양 속에 있는 것은 오행의 기운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검은 색으로 한 것이며, 지극히 양(陽)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발을 세 개로 그린 것이다.
주작(朱雀)은 태양을 물고 오는 새
해동역사 물산지에는 '후한서'를 인용하여 마한에는 장미계(꼬리가 긴 닭)가 있다. 꼬리의 길이가 5척이다라고 하였는데 마한의 특산종인 긴 꼬리 수탉이 새벽 하늘을 열고 태양을 부른다는 것이다. 긴 꼬리 닭의 부리에 태양을 그린 것은 바로 태양을 불러오는 새이기 때문이다. 이를 주작(朱雀)이라 한 것이다.
고구려 벽화에 주작(朱雀)의 형태는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부리에는 태양으로 보이는 붉은 구슬을 물고 있으며 곧 하늘을 날아오려려는 형상이다. 주작(朱雀)은 사신도에서 남방을 상징하는 동물이며 닭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은 긴꼬리 닭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 더 결정적인 것은 다리의 모습인데 장닭의 두다리에는 소위 싸움 발톱 또는 며느리 발톱이라는 것이 뒷쪽으로 튀어나와 있다.

주작도의 며느리발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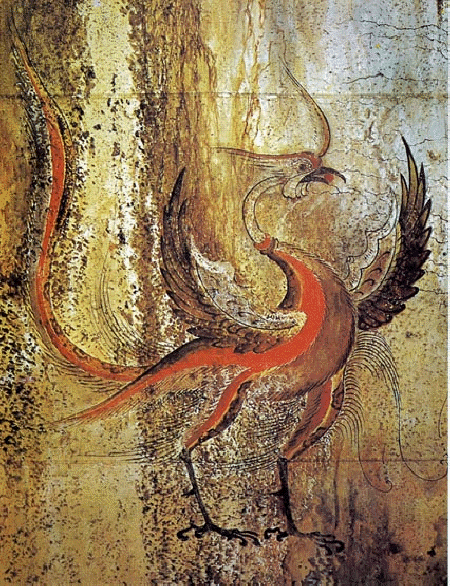

최근에 복원된 긴 꼬리 닭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장닭의 며느리발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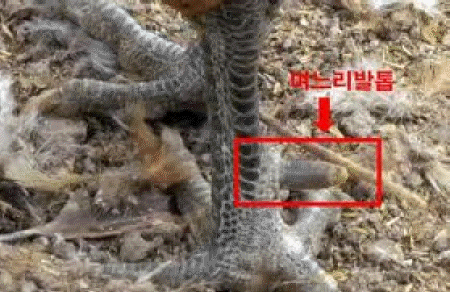
며느리 발톱은 4~5년이면 빠지고 다시 자라는데 나이가 많을 수록 길게 자라있다. 싸움닭에게는 필살의 무기이며 암닭에게는 흔적만 있고 자라지 않는다. 꿩에게서도 볼 수 있지만 장닭의 것이 훨씬 길게자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황(鳳凰)이든 주작(朱雀)이든 하나 같이 다리의 형상은 우리나라 장닭의 그것과 똑 같이 생겼다. 그러면 부상나무 꼭데기에 서서 태양을 불러오는 새는 장닭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봉황(鳳凰)과 주작(朱雀)을 잘 구분하지 않으려한다. 어떤이는 같다고도 한다. 봉황(鳳凰)과 주작(朱雀)은 다른 새이다. 봉(鳳)은 암컷, 황(凰)은 수컷이며 봉황(鳳凰)은 항상 암.수가 함께 다닌다. 고구려벽화의 사신도에 봉황을 그렸다면 암 . 수 한쌍을 그려야할 것이다.
주작(朱雀)은 닭을 그린 것이며 남방의 수호신으로 상징화 시킨 것이다.
[인용문]
해동역사 제27권 / 물산지(物産志) 2
금류(禽類)
봉(鳳)
○ 봉은 신조(神鳥)이다. 동방의 군자국(君子國)에서 나는데, 사해(四海)의 밖에서 날아올라, 곤륜산(崑崙山)을 지나서 지주(砥柱)에서 물을 마시고 약수(弱水)에서 깃을 씻고, 저녁에는 풍혈(風穴)에서 잔다. 이 새가 나타나면 천하가 크게 태평해진다. 《설문(說文)》
맹조(孟鳥)
○ 맹조는 맥국(貊國)의 동북쪽에서 나는 새의 이름으로, 그 새의 무늬는 적색, 황색, 청색이다. 《산해경(山海經)》
닭[鷄]
○ 마한에는 장미계(長尾鷄)가 있는데, 꼬리의 길이가 5척(尺)이다. 《후한서》
○ 살펴보건대, 《삼국지》에는 세미계(細尾鷄)로 되어 있다.
○ 장미계는 꼬리가 가늘면서도 길어 길이가 3척이나 되며, 조선국에서 난다. 《교광지(交廣志)》
○ 조선에는 장미계 한 종이 있는데, 꼬리의 길이가 3, 4척 되며, 맛이 살지고 좋아 다른 닭보다 훨씬 좋다. 《본초강목》
○ 백제에는 닭이 있다. 《수서》
○ 닭 가운데 백두(白蠹)란 닭이 있는데, 살지고 기름졌는데, 조선의 평택(平澤)에서 난다. 《본초경(本草經)》
○ 《명의별록(名醫別錄)》 주(注)에, “조선은 현도(玄?)와 낙랑(樂浪) 지역에 있어서 닭이 나는 곳이 아니다. 《본초경》에서 말한 백두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이는 아마도 별도의 한 종류인 듯하다.” 하였다.
○ 닭은, 약(藥)에 넣을 때에는 대개 조선에서 나는 것을 쓰는 것이 좋다. 《개보본초(開寶本草)》
[인용 끝]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금동 대향로
부상나무(扶桑樹) 꼭데기의 태양새이다. 부리 아랫턱에 태양을 이고 발 뒷쪽에 발톱이 길게 자라있다. 대향로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백제금동용봉봉래산대향로]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봉래산, 용, 봉은 모두 헛발 딛은 것이다.
후한(後漢) 말 훈고학자 유희(劉熙)는 석명(釋名)이란 책에 닭 요리는 한국(韓國)이 으뜸이라고 하였다. 우리말에 안성맞춤, 제주감귤이란 말 처럼 한국(韓國)의 양, 토끼, 닭 등에도 한국(韓國)명을 붙여 ‘한양(韓羊)ㆍ한토(韓兎)ㆍ한계(韓鷄)라고 하면서 그 요리(料理)의 본법(本法)은 한국(韓國)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 ...劉熙釋名, 韓羊 韓兎 韓鷄 本法出韓國而爲也 猶酒言宜城醪蒼梧淸之屬也 "
" 유히가 석명에서 말하기를 한양, 한토, 한계라는 것은 본래 그 본법이 한국에서 나와 된 것이다. 술에 의성료니 창오청이니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종류다. "
삼한(三韓)의 대표국은 마한(馬韓)이므로 한국(韓國)이라 함은 마한(馬韓)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해동역사 물산지(物産志)에 조선은 현도(玄菟)와 낙랑(樂浪) 지역에 있어서 닭이 나는 곳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닭이 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추운 지역이라서 따뜻한 남방에 사는 닭을 키우기에는 적당한 곳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마한에는 장미계(長尾鷄)가 있다. 장미계는 조선국에서 난다. 백제에는 닭이 있다. 백두(白蠹)란 닭은 조선의 평택(平澤)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조선과 삼한의 강역은 북쪽으로 현도 낙랑을 포함하여 대륙의 남방까지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뽕나무의 원산지와 마한의 닭으로 생각해도 우리의 고토는 대륙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배재대학교 손성태 교수는 STB 상생방송 역사특강 " 우리 韓민족의 대이동" 에서 말하기를 19세기 말 1898년 미국인 학자들이 아무르강 유역을 탐험했는데 그곳에 있던 주민들의 옷이나 가구등에 장식으로 이상한 새 문양을 그린 것이 많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은 주로 짐승이나 물개의 가죽으로 만든 것인데 바로 아래의 그림과 같은 것으로 태양새를 새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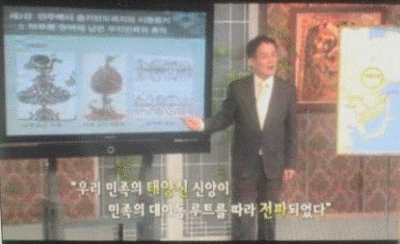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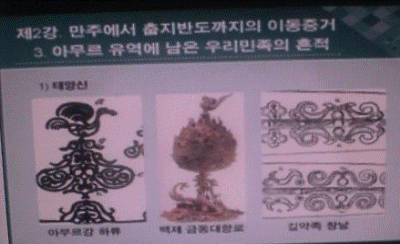
백제금동대향로와 아주 유사한 형태이며 그곳의 주민들은 그 문양이 바로 닭을 그린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추운 곳에 닭은 한마리도 없는데 당신들은 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으니 만주인들이 전해 준 것이며 그들도 닭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백제금동대향로의 태양새는 닭이라는 것을 인정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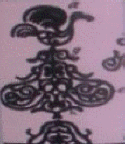
새의 입에 태양을 물고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하지만 환인천제께서 천산에서 개벽하시고 3천 년이 흐른 후에 동이들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 서방으로 진출한 민족은 '메소포타미아'와 '수메르' 문명을 건설하였고, 남방으로 진출한 민족은 '인도문명'을 건설하였다. 북방과 동방으로 진출한 환웅족은 발해 대평원에서 인류 최초이자 최대의 초고대문명국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그런 발해 대평원을 다른 말로는 배달, 밝달, 박달이라고 하였다. 발해는 원래 '뻘밭'을 뜻하는 싯담어이며, 동국정운에 기록한 발(渤)자의 정확한 발음은 '뻘'이다. 즉, 갯뻘을 말한다.
* 발(渤)[ ] 동국정운 2:29
] 동국정운 2:29
* va-ra 산스크리트 : 뻘, 갯벌, 안개 자욱할. (강상원, 漢字는 東夷族 文字 註釋 . 한자는 동이족 문자 주석 193쪽)
va-ra(빠라)는 바다라는 뜻이다. 안개가 자욱한 뻘밭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해변을 말하며 벌(伐)이라는 명사로 사용될 때 평야, 대평원의 뜻도 된다. (비교 : 황산벌, 서라벌, 셔벌 등)
박달이라 하는 것도 발해와 같은 뜻이다. 산스크리트 밝,박,발(渤)은 va-ra : 바다, 갯뻘의 뜻이고, 달(dhar)은 땅(따.地)을 의미한다. 발해(渤海)의 海는 땅과 같은 의미로 쓰였으나 나중에 수몰되어 바다가 되었으므로 발해(渤海)라 하였다.
흔히, 배달(倍達)을 밝달이라 하고 박달이라고도 하는데, 지명을 말할 때는 발해(渤海)라 하고, 민족을 말할 때는 배달(倍達)이라 한다. 박달나무는 배달(倍達)을 상징하는 나무를 말하며 이를 웅상(雄常)이라 한다.
약 8천 년 전부터 발해(渤海)는 서서히 수몰되기 시작하는데, 단군시대가 개국하자 평양이 물에 잠기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약 5천 년 전에는 배달(倍達) . 발해(渤海) 최대의 전성기였으며 그때 바닷물이 많이 차올라서 봉래, 방장, 영주는 섬이 되었던 것이다.
봉래산 금동 향로
봉래산(蓬萊山) 령봉(靈峯) 부상나무에, 고요히 서 있는 저 주작(朱雀)만이, 그 옛날 발해의 영화를 말해주고 있을 뿐, 그 누구도 우리 역사를 알지 못하는 구나.
신선의 발자취는 바다 속으로 사라졌으니, 파도는 쉼없이 물결치며, 남명(南冥)으로 날아간 붕새(鵬鳥)가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
구만리 하늘 아래 붕새(鵬鳥)가 있으니, 아! 세월은 더디기만 하여라.
'행운으로행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TV Top10 (0) | 2016.09.20 |
|---|---|
| [스크랩] 달리는 호화호텔 18억원짜리 버스 (0) | 2016.09.18 |
| [스크랩] 즐거운 노부부(老夫婦). (0) | 2016.09.17 |
| [스크랩] 핑크색 크로셰 뜨개질로 뒤덮은 집 (0) | 2016.09.14 |
| [스크랩] 꼭 봐야 하는 엄청난 사진들! (0) | 2016.09.14 |